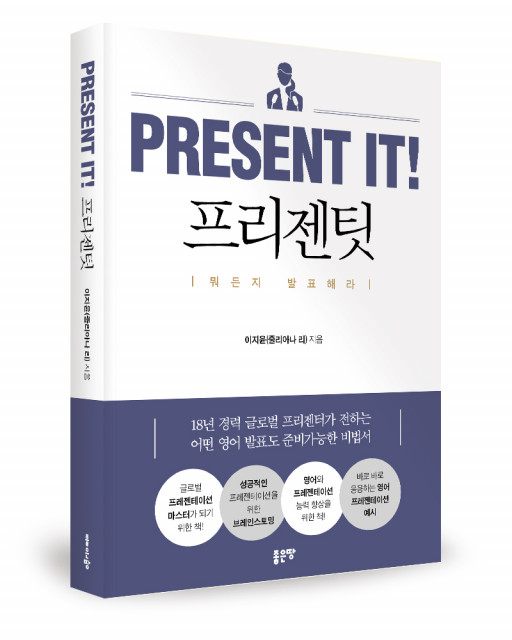‘문화재’라는 용어가 앞으로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현행 문화재청이라는 정부 부처 명칭도 국가유산청(처)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화재청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전영우)·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장 신탁근)는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했다. 두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에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고수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해 제정한 것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즉 ‘문화재’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뿐인 점, 문화‘재(財)’라는 용어가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천연기념물(동식물‧지질)‧명승(경관) 등 자연물과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점, 국내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문화재보호법 상 분류체계가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가 돼 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문화재 개념보다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명칭 변경 및 분류 체계 개선은 이런 의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맞추는 등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문화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같은 개선 방침에 따라 문화재(財)라는 명칭은 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한다.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하고, 목록유산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벗어나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한다. 또 등록유산과 목록유산의 대상을 문화유산에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제안을 적극 수용해 관련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관련 법 체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옥 문화전문기자 yosohn@kmib.co.kr